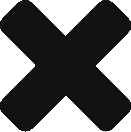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아진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자식 세대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예민하실까?”라고 속으로 불편해한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서운함만 쌓이고, 결국엔 말수가 줄어든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노인의 뇌에서는 젊을 때보다 더 자주, 더 강하게 자동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상황이 오면 숙고하지 않고도 바로 반응하는 습관화된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뭔가를 도와주려 하면 “됐어, 내가 할 수 있어”라며 화를 낸다. 누가 조언을 하면 “내가 그걸 모를까 봐?”라며 쏘아붙인다. 때로는 상대가 말하지 않은 의도까지 읽어내고 먼저 상처받는다. 이런 반응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밴 신경망의 자동 작동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 전두엽이 퇴화해 판단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해마는 위축되어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무엇보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회로가 강화되면서, 감정이 앞서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자주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고착되면, 더 이상 변화나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고착된 반응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노인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든다는 점이다. 자식이나 손주들은 점차 대화를 피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느라 진심을 나누기 어렵다. 노인은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끼지만, 실은 스스로 관계를 닫고 있는 셈이다. 마음은 외롭고 서운한데, 행동은 점점 더 단호하고 배타적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알아차림’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 반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들여다보는 것. 예를 들어, 손주가 휴대폰을 보느라 대답을 늦게 했을 때,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서운했지?” 하고 한 번 멈춰보는 것이다. 그 짧은 멈춤이 곧 알아차림이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양이 아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과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된 알아차림은 고착된 신경망의 회로를 점차 느슨하게 풀고, 더 부드러운 반응과 관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것은 풍부한 지식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유연함과 타인에 대한 여유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조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자기 반응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한다. 고정된 신경망은 알아차리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 또 이렇게 반응했지?” 하고 물을 수 있는 용기, 그 질문 하나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내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