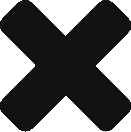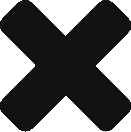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 나라는 것은 그저 망상일 뿐이다.
- 뇌는 생존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도록 진화해 왔다.
- 자아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 부분을 편집하고 맥락을 이어 붙인 기억의 집합체이다.
- 인지는 과거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진 물리적 현실의 혼합물이다.
- 우리 뇌는 보거나 듣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다.
- 인간의 자아는 필연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 기억의 혼합물이다.
- 사랑, 증오, 부끄러움, 기쁨 같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느낌도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결과물일 뿐이다.
- 인간은 자신의 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자각할 수 없다. 뇌는 그 자체의 촉각과 감각을 느낄 수 없다.
- 뇌는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을 구성한다.
- 우리가 자아라고 지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공의 구성물이다. 다시 말해 자아는 뇌의 시뮬레이션이다.
- 자아에 대한 오인: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 자신에 대한 모습은 뇌가 당신의 모습과 목소리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이다.
- 나라는 실체적 진실조차 뇌가 만들어낸 왜곡의 결과물이다.
-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온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라는 관념 자체도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 작화증이란 기억의 빈틈을 채우는 기억 메꾸기이다.
- 사람들은 지난 일의 세부사항은 잊어버렸는데도 자신이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착각한다.
- 기억의 정확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기억들은 교정되기보다는 계속 왜곡되어 우리 뇌 깊이 새겨진다.
- 기억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없는 것, 놓친 것을 채워 넣는다.
-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 뇌는 기억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 비선언적 기억은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기억을 의미한다. 반면 선언적 기억은 내측 측두엽에 의존하는데 이곳에 해마가 있다.
- 뇌에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한다.
-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 현재의 우리가 된다.
- 우리의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 유년기의 스토리텔링 과정
- 유아들은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2~3세 아이들은 자신들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 직접 경험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된 지식을 기반으로 자아가 확장된다. 이는 3세 전후에 발생
- 확장된 자아가 더욱 확장되어 친구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3~5세 경에 일어난다.
- 5~9세가 되면 레퍼토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기억은 여러 조각의 묶음이며 그 빈 구멍은 임의로 메워진다.
- 뇌는 편집자처럼 사진의 빈곳을 메워 균일해 보이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 뇌는 불완전한 편집자이다. 우리 기억은 기껏해야 일어나는 사건의 압축된 버젼일 뿐이다.
- 뇌와 컴퓨터는 사용자가 다르다. 뇌는 당신을 바로 현재의 당신으로 만드는 컴퓨터이다. 뇌에서 사용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살인자들에 대해 유일하게 연구된 신경과학 사례는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인자들의 전전두엽 활동이 감소했다.
- 공자가 이야기한 도는 개인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 프랑클이 이야기한 의미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의미를 찾는 방법은
- 무엇인가를 창조한다.
- 무엇인가를 경험한다.
-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 “만약에 ~라면 어쩌지”
- 신경망을 만들 때, 쓰레기를 읽으면 쓰레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