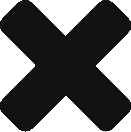두뇌의 동작 원리(BGPEUCS 원리)
-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두뇌의 동작이다.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 존재한다(두뇌의 역할: Brain role).
- 신경망은 태어날 때 타고난 부분(뇌간과 변연계 일부)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대뇌피질, 변연계), 나이가 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퇴화한다(성장과 퇴화: Growth & Degeneration).
- 두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반응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훗날을 위해 기억한다. 두뇌 신경망은 가소성이 있고, 경험을 통해 변한다(가소성: Plasticity).
- 두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였다.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두뇌가 만든 도구다(진화: Evolution).
- 두뇌는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대부분 프로그램된 대로, 무의식적으로, 습관대로 동작한다(무의식: Unconsciousness).
- 의식은 변화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의식도 두뇌가 만든 진화의 산물이다(의식: Conscoiusness).
- 나란 것은 두뇌가 만든 것이다. 나를 만드는 신경망은 가변적이며, 고정 불변의 나란 것은 없다(자아: Self).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 우리는 나의 신경망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나의 신경망으로 해석한 것이다. 두뇌 신경망이 다르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한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 두뇌에 손상을 입으면 손상된 부분이 담당하던 기능이 상실된다. 중풍으로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말을 못 하게 되고, 우측 운동중추가 손상되면 좌 반신 불수가 된다. 중풍으로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말을 못 하게 되고, 우측 운동중추가 손상되면 좌 반신 불 수가 된다 중풍으로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말을 못 하게 되고, 우측 운동중추가 손상되면 좌 반신 불수가 된다.
- 옳고-그름, 정상-비정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에 사는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요사이는 인정하는 추세다.
- 어릴 때 형성되는 신경망이 아주 중요하다. 육아 환경이 아이의 신경망을 훈련하는 Big Data이므로, 안정되고 평온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자식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신경망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부부간에는 늘 싸우고,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며느리를 구박한다.
- 기억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후회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올 일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다.
- 두뇌는 오감을 통해 입력된 환경 신호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행복하게 느껴지고, 불리하면 고통스럽게 느낀다. 두뇌가 만드는 감정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 두뇌는 원시밀림에서 만들어져 현대사회를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동작 한다. 원시밀림과 현대사회는 너무나 다른데 밀림에서 형성된 신경망을 유전받아 현대를 산다. 그래서 인지편향과 오동작이 아주 심하다.
- 우리는 원시밀림의 경험으로, 언제나 배가 고프다. 늘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낸다.
- 원시밀림에서 생명이 위험하면 Fight/Flight 반응이 일어난다. 즉 심장이 뛰고, 눈이 동그랗게 되고, 얼굴이 뷹어지며,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즉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적합한 형태로 대비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마누라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이런 생리현상이 일어나니, 두뇌가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오동작하는 것이다.
- 우리는 내 편이 실수하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상대편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비판적이다. 원시밀림에서는 내 편/네 편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내 사정을 몰라주는 상대가 답답하지만, 나는 상대의 입장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실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상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나면 “모르잖아” 하고 인정하라.
- 두뇌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한다. 환경에 변화가 없으면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하는 것이 이상적인 동작 방식이 될 수 있다.
- 사람은 자란 환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 대부분 어릴 때 형성된 신경망으로, 무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 인간은 변하기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신경망이 바뀐다는 이야기이고, 신경망을 꾸는 것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라. 자신의 신경망도 바꾸기 어려운데, 상대를 바꾸는 것은 상대가 공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두뇌가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하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알아차려야, 즉 의식해야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하면 괴로울 수 있다.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된 대로 사는 것이 갇혀 사는 것이다. 갇혀 살면 고통이 따른다.
-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왜냐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에 따라 행-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비바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부러 나쁜 환경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돈이나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비바람 같은 사람이다. 사람도 환경의 일부로, 친구가 좋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 좋은 신경망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좋은 신경망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신경망이다. 그러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평온하다.
- 신경망은 개선될 수 있다. 단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 우리는 나란 것의 생존을 위해, 내 실수의 원인은 환경에서 찾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내면에서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신경망을 개선할 기회가 없다. 상대 실수의 원인은 환경에서 찾고, 내 실수는 내면에서 찾는 성찰을 습관화해야 한다.
- 의식은 두뇌가 만들었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깨어있어야, 의식해야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원시 환경과 비슷하면 프로그램된 대로 살면 되지만, 환경 변화가 심하면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한다.
- 나이가 들면 두뇌가 퇴화한다. 퇴화하면 그만큼 기능도 사라진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행동이 둔해지고, 잘 잊어먹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고, 고집이 세진다. 그러나 노인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 신경망이 손상되면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이 오고, 심하면 환각이나 임사체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신경망이 크게 망가지면 의식도 사라진다. 잘 때 의식이 없듯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
- 의식이 없으면 알아차림도 없다. 두뇌가 만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환각도 없고, 임사체험도 없다.
- 죽은 후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 이야기는 인간들의 두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 깨달음도 신경망 동작의 한 형태이다.
- 나란 것은 시간적으로 연속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두뇌는 이를 위해 빈 정보를 채우고, 많은 이야기를 지어낸다. 작화한다.
- 나란 가변적이다. 불변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란 것에도 갇혀 살지 마라.
-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경험하지 않으면 신경망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다. 젊어서는 늙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 부모가 평생 살던 환경을 버리고 자식따라 서울 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식은 알기 어렵다.
-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배운다. 내가 부모를 섬긴 방식으로 자식도 나를 섬긴다.
- 두뇌는 많은 부분이 오동작한다. 마누라 말 한마디를 생명의 위협으로 화가 나는 것도 오동작이고, 돈이나 권력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두뇌의 오동작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욕심도 두뇌의 오동작이다.
- 상대를 고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다. 자신의 두뇌는 본인만 고칠 수 있고, 그것도 무수히 반복 연습해야 가능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한다. 독약일지라도 2~3번 “그것은 독약인데” 하고 이야기해 줄 뿐이다. 먹고, 안 먹는 일은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은 일이 아니다.
- “모르잖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해야 한다. 상대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모르는 상태에서 반응해야 한다면 지혜롭게 반응하라.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바쁜가 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이다.